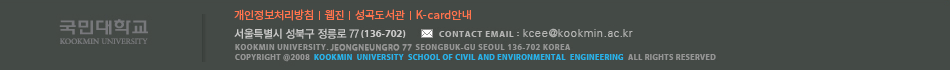ИЎКёОЦРЧ ЕЖРчРк ФЋДйЧЧ ЛчИС РЬШФ СпБЙ РЮХЭГнПЁМДТ 'ФЋДйЧЧРЧ РЏО№'РЬЖѓДТ ЧГРкИИШАЁ РЮБтИІ ВјОњДй. ШФГ(ћЩбѕ)МКРЧ Чб ОЦИЖУпОю ИИШАЁАЁ БзЗШДйДТ РЬ ИИШПЁМ СзОюАЁДТ ФЋДйЧЧДТ ШћАуАд МеРЛ ГЛЙаОю "ГЊИІ 301КДПјРИЗЮ ЕЅЗСАЁ ДоЖѓ"Аэ ШЃМвЧбДй. КЃРЬТЁРЧ 301КДПјРК РхТМЙЮ(ЫАїЪкХ) Рќ БЙАЁСжМЎ Ею СпБЙ УжАэСіЕЕКЮАЁ ФЁЗсИІ ЙоДТ АїРЬДй.
РЬ ИИШАЁ ЧГРкЧЯАэ РжДТ АЭРК ФЋДйЧЧАЁ ОЦДЯЖѓ Рќ ММАшРЧ ПєРНАХИЎАЁ ЕШ СпБЙ ПмБГДй. ФЋДйЧЧ СЄБЧРЬ РќХѕБтБюСі ЕППјЧи ЙнСЄКЮ НУРЇДыИІ ЧаЛьЧпРЛ ЖЇ СпБЙРК 'ГЛСЄ КвАЃМЗ ПјФЂ'РЛ ГЛММПі МЙцРЧ АјНРПЁ ЙнДыЧпДй. МіЕЕ ЦЎИЎЦњИЎАЁ ЧдЖєЕШ РЬШФПЁЕЕ КИИЇ РЬЛѓ ЙнБКРЛ РЮСЄЧЯСі ОЪАэ ЙіХсДй. ЧдВВ АјНРПЁ ЙнДыЧпДј ЗЏНУОЦАЁ ДыММИІ РаАэ РчЛЁИЎ ЙнБК РЮСЄ ТЪРИЗЮ ЕЙОЦМЙРЛ ЖЇЕЕ СпБЙРК СжРњСжРњЧпДй. Бз АсАњЗЮ СпБЙПЁ ГВРК АЭРК АЂСО ДыЧќ ЧСЗЮСЇЦЎРЧ СпДмПЁ ЕћИЅ 150ОяДоЗЏИІ ПєЕЕДТ АцСІРћ МеНЧАњ ЙнБК УјРЧ ДоАЉСі ОЪРК НУМБРЬОњДй.
СіГ 9Пљ ЧЯМј ФЁЗЏСј ОЦЧСИЎФЋ РсКёОЦРЧ ДыМБ АсАњЕЕ СпБЙПЁДТ ЛРОЦЦЭДй. 20ГтРЛ С§БЧЧи ПТ ФЃСп(ібёщ) МКЧтРЧ ДйРкЙЮСжПюЕП(MMD) МвМг ЗчЧЧОЦ ЙнДй ШФКИАЁ ЙнСп(куёщ) РЬНДИІ ГЛАЧ ОпДч ШФКИ ИЖРЬХЌ ЛчХИПЁАд ТќЦаЧб АЭРЬДй. ЛчХИ ШФКИДТ МБАХ БтАЃ ГЛГЛ "СпБЙРЬ РсКёОЦРЧ БИИЎБЄЛъРЛ ОрХЛЧи АЃДй"Аэ СпБЙРЛ АјАнЧпДй. РсКёОЦ БЄЛъПЁ ХѕРкЧб СпБЙ БтОїРЬ ЧіСіРЮ ДыНХ СпБЙРЮ БйЗЮРкЕщРЛ ЕЅЗСДй АэПыЧЯАэ РжДТ СЁРЛ КёЦЧЧб АЭРЬДй. ДчМБЕШ ЛчХИ ШФКИИІ ЙцЙЎЧб ЧіСі СпБЙДыЛчДТ "РсКёОЦ Й§ЗќРЛ Рп СиМіЧЯЖѓ"ДТ АХКЯЧб УцАэБюСі ЕщОюОп ЧпДй. РкПјПЁ ДыЧб ХНПхРИЗЮ ЙАКв АЁИЎСі ОЪОвДј ПмДЋЙкРЬ ПмБГАЁ КњРК ТќЛчПДДй.
СпБЙ ПмБГРЧ НУЗУРЬ РЬАЭИИРИЗЮ БзФЅ АЭ ААСіДТ ОЪДй. ГЛГт УбМБРЛ ОеЕа ОЦЧСИЎФЋРЧ ЖЧ ДйИЅ ЕЖРчБЙАЁ ОгАёЖѓПЁМЕЕ ЙнСп ИёМвИЎАЁ ФПСіАэ РжДй. СпБЙРЬ РЏПЃРЧ СІРч АсРЧПЁ ЙнДыЧб СпЕПРЧ НУИЎОЦПЁМЕЕ ОюЖВ РЯРЬ РЯОюГЏСі И№ИЃДТ ЛѓШВРЬДй. РЏПЃДыЛчБюСі СіГН СпБЙРЧ Чб АэРЇ ПмБГАќРК УжБй Дч БтАќСі БтАэЙЎПЁМ 'РЯПБСіУп(ьщчЈђБѕеЁЄЧЯГЊРЧ РЯРЛ КИИщ ДкУФПУ ДыММИІ ОЫ Мі РжДйДТ Жц)'ЖѓДТ ИЛЗЮ РЬЗБ УпММПЁ ДыЧи БэРК ПьЗСИІ ГЊХИГТДй.
СпБЙ ПмБГАЁ РЬУГЗГ АяАцПЁ КќСј СжЕШ РЬРЏЗЮ РќЙЎАЁЕщРК 'АќМК(ЮБрѕ)'РЛ ВХДТДй. СпБЙРЬ ОЦСїЕЕ 1950ГтДыПЁ МіИГЕШ ЦђШАјСИ 5ПјФЂАњ 1960~1970ГтДыПЁ РЏЧрЧпДј КёЕПИЭ ПмБГПЁ ИХДоЗС БЙСІСЄФЁРЧ КЏШ ШхИЇПЁ РћРРЧЯСі ИјЧЯАэ РжДйДТ АЭРЬДй. ПЉБтПЁ "СпБЙ АцСІЙпРќПЁ ЕЕПђИИ ЕШДйИщЁІ"РЬЖѓДТ БтСи ЧЯГЊАЁ ДѕЧиСЎ СпБЙ ПмБГДТ БЙСІЛчШИРЧ АјЗа(Эыжх)ПЁ ОЦЖћАїЧЯСі ОЪАэ РкБЙРЧ РЬРЭИИ УЌБтДТ ПЯАэЧб И№НРРИЗЮ КёФЁАэ РжДй. СпБЙРЬ СжЕЕИщЙаЧб ГЛФЁ(вЎіН)ПЁ КёЧи ПмБГ ПЊЗЎРК ХЮОјРЬ ЖГОюСјДйДТ ЦђАЁЕЕ ГЊПТДй.
ПУЧиДТ СпБЙРЬ РЏПЃПЁМ ДыИИРЛ УрУтЧЯАэ ДыНХ АЁРдЧб Сі 40СжГтРЬ ЕЧДТ ЧиРЬДй. СіБнРК ЙЬЁЄМв ОчБЙ ЛчРЬПЁМ ДЋФЁИІ КСОп ЧпДј ГУРќНУДыЕЕ ОЦДЯАэ, СпБЙРЧ РЇЛѓЕЕ АњАХПЁ КёЧв Мі ОјРЛ ИИХ ГєОЦСГДй. СпБЙ ПмБГАЁ Бз РЇЛѓПЁ АЩИТРК МКМїЧЯАэ УЅРг РжДТ И№НРРЛ КИПЉСжСі ИјЧбДйИщ СпБЙПЁ ЕюРЛ ЕЙИЎДТ ГЊЖѓДТ АЅМіЗЯ Дѕ ДУОюГЏ АЭРЬДй.